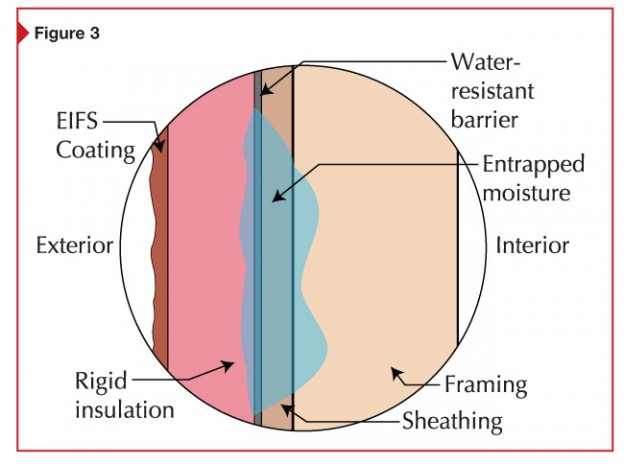하늘에서 쏟아져내리는 빗물을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홈통과 수직우수관이다. 요즈음에는 주인장의 취향때문인지 아니면 건축사의 의견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히든거터란 이름으로 홈통과 수직우수관을 외피내부로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. 자신들의 돈으로 자신들의 취향대로 주택을 꾸민다는데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주택의 유지관리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듯 하다. 왜냐하면 누수문제가 생기게 되면 실내생활에 직접적인 불편함은 기본옵션이 될 듯 하고 보수하는데 있어서도 쉽지않기 때문이다. 여차하면 지붕과 벽체일부를 몽창 뜯어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. 그래서 홈통과 우수관은 원래의 위치에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편이 좋을 듯 하다는 것..